[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07022005&wlog_tag3=daum#csidx217a7e42b325ff599326da0f67f97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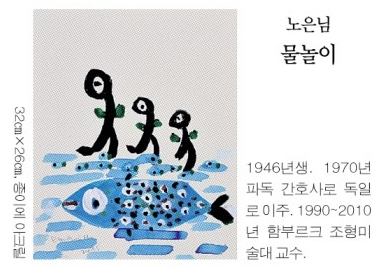
요리사의 책상/남진우
내 타자기로는
빵을 굽거나 생선을 튀길 수 없다
서투른 요리사처럼 손가락 끝으로 톡톡 쳐봐도
백지엔 부서진 글자의 파편만 어지러이 나뒹굴 뿐
그 어떤 조미료도 국물도 없이
나는 황야를 떠돌며 주린 배를 채워야 한다
때로 책상 앞에서 잠시 잠에 빠지면 타자기는 나 대신
빵을 굽고 생선 튀기는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보글보글
끓어넘치는 타자기
방 안을 떠다니는 온갖 음식들의 향기
자판이 움직일 때마다 밀가루 반죽이 퍼져나가고
수면 위로 튀어오른 생선이 비늘을 번득인다
늦은 저녁
타자기가 맹렬히 달려가고 있다
텅빈 거리 저편 홀로 불 환히 켠 식당을 향해
배고픈 입 한껏 벌리고
| |
새해 첫날 누가 ‘시 써서 먹고살 만하냐’고 물었습니다. 예부터 없고 귀해 그랬겠지만 같은 값이면 ‘웃고 살 만하냐’ ‘놀고 살 만하냐’ 물으면 더 좋을 텐데, 그래도 딱히 굶은 적은 없으니 살 만하게 살았나 봅니다. 그만큼 먹고사는 일이 중하니, 글 쓰는 사람에겐 타자기가 밥솥이자 불판일 테고, 우리 모두는 결국 제 삶을 위한 요리사일 겁니다. 시에서 보이는 대로 타자기가 저절로 글을 써서 음식을 구해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꿈을 꾸는 것처럼 정말 내가 아니라 타자기가 글을 쓰고 있는 듯한 때가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 ‘이상한 느낌’이 이 분명한 ‘먹고사는 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일까요? 마치 사랑처럼 말입니다. 시의 마지막 대목처럼 밥을 하는 사람도 배가 고픈 법입니다. 살기가 힘드니까 사랑하기도 힘들지만, 새해에는 모두 ‘사랑하고 살 만하다’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신용목 시인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07022005&wlog_tag3=daum#csidx062317485392efa97b2637079283d73 
'<시 읽기·우리말·문학자료> > 그림♠음악♠낭송 시(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송년/김규동 (0) | 2017.01.10 |
|---|---|
|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밤눈/김광규 (0) | 2017.01.10 |
| 이상옥 교수의 디카시가 있는 고성-3 (0) | 2017.01.06 |
| [장석남] 여행의 메모 - 문학집배원 시배달 박성우 (0) | 2017.01.05 |
| [그림과 詩가 있는 아침] 어떤 성화(聖畫)/이시영 (0) | 2016.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