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웅 기자
입력 : 2013.02.21 02:29
[어수웅 기자의 북잇수다] [5] 시인 신달자
빚… 지긋지긋했던 남편·시어머니 병수발… 친지들의 냉대
우리 모두 멀쩡한 것 같지만 "힘내라"는 말 필요한 사람들
등단 50년, 난 아직 이류 시인… 오늘도 詩 앞에 무릎 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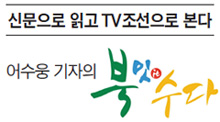
시인 신달자(70)에게는 두 개의 서랍이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제재소 사장이었던 아버지의 서랍. 1950년대였다. 경남 거창의 부잣집 다섯째 딸이었던 소녀 달자는, 언제나 꽁꽁 잠겨 있던 아버지 사무실의 책상 가운데 서랍이 늘 궁금했다. 아버지는 '접근 금지' 엄포를 놨고, 소녀는 그 서랍이 돈다발이 두둑한 금고일 거라 믿었다. 하루는 신기하게도 서랍이 열려 있었는데, 아버지가 없었다. 소녀는 살며시 금기(禁忌)로 다가갔다.
―예상대로 돈다발이 두둑하던가.
"돈은 한 푼도 없었다. 대신 5권의 공책이 있었다. 그중 4권 가득 글이 빽빽했다. 아버지의 일기였다. 첫 구절은 '오늘도 외로웠다.' 충격이었다. '외로웠다'라니. 아버지의 겉모습은 저렇게 근사한데, 안에는 저런 것이 살고 있었구나.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미소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진실로 읽어야 할 존재였구나."
두 번째 서랍은 20여 년 뒤에 등장한다. 이번엔 소녀 가장, 아니 주부 가장 신달자였다. 20년 시간의 강을 사이에 두고 그녀의 삶은 추락했다. 100평의 장미밭이 있었던 친정집은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고, 엄마의 만류를 무릅쓰고 한 번 결혼했던 15세 연상의 남자와 치렀던 혼사는 그 사내의 뇌졸중으로 돌아왔다. 1977년. 큰딸이 초등 2학년, 막내인 셋째 딸이 두 살 때였다. 넋이 빠진 그녀는 습관적으로 장롱 서랍을 뒤졌다고 했다.
―이번 서랍에는 무엇이 있었나.
"아무것도. 문제는 뭘 찾는지도 모르면서 툭하면 뒤졌다는 거다. 문학에 대한 그리움일까. 내 잃어버린 삶일까. 남편은 24년을 앓았다. 저세상으로 간 게 2000년의 일이었다. 그 사이 팔순 시어머니가 척추골절로 반신불수가 됐다. 아흔에 돌아가실 때까지 옆 방에서 9년을 누워 있었다. 정말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다."
이 두 서랍 사이의 낙차와 격차가 오늘의 시인을 만든 게 아닐까. 이날 '북잇수다' 녹화 전까지, '우아한'이라는 형용사로만 시인을 규정했던 건 편견이었다.
 "그래도 니는 될기다." 어릴 땐 그렇게 싫었던 어머니의 그 말을, 시인 신달자는 지금 힘들 때마다 새긴다. 그러면 또 영양제 주사 맞은 듯 기운을 차린다. 신기한 일이다. /이태경 기자
"그래도 니는 될기다." 어릴 땐 그렇게 싫었던 어머니의 그 말을, 시인 신달자는 지금 힘들 때마다 새긴다. 그러면 또 영양제 주사 맞은 듯 기운을 차린다. 신기한 일이다. /이태경 기자

―시인의 산문집에서 '남편을 차라리 살리지 말 걸'이라 적은 걸 봤다. 정신이 망가진 남편이 매질을 했다는 얘기도. '그 시절 어머니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나는 여름밤 벼락이 치면 나가지 못한다. 벼락은 무서웠던 것이다'라는 구절도 읽었다.
"정말 자주 했던 생각이었다. 그때는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원도 여러 번 갔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굴욕을 참아내는 이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굴욕, 어떤 이빨?
"친정도 무너지고, 생계가 막연했다. 그때는 남자들이 양복을 맞춰 입을 때였다. 시동생 친구에게 물건을 받아 양복지를 팔러 다녔다. 예전에 도움을 줬던 아는 언니가 2층 양옥집에 산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다. 나는 그 언니가 나를 보면 붙잡고 울어줄 줄 알았다. 그런데 양복지를 햇볕에 비춰보며 흠을 잡기 시작하더라. 너무 놀라 양복지를 잡어챈 뒤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다. '두고 봐라'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뭐라도 괜찮은 걸 해야 딸 시집이라도 보낼 수 있겠구나 싶었다.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아이들 키우고, 두 사람 병수발 하고, 집안일이 새벽 2~3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공부를 했다. 요 깔고 자본 적이 거의 없다. 새벽이 정말 싫었다. 또 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너무 아득했으니까."
시인은 그렇게 40대의 12년을 바쳐 숙명여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쳤다. 그 사이 두 번째 수필집 '백치애인'이 운좋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어서 썼던 장편 소설 '물 위를 걷는 여자'는 150만부가 훌쩍 넘게 팔리며 쌓였던 빚도 갚았다. 1990년대의 일이다.
 북잇수다 촬영현장. 왼쪽부터 표정훈, 신달자, 손미나, 어수웅.
북잇수다 촬영현장. 왼쪽부터 표정훈, 신달자, 손미나, 어수웅.

―우아하고 고상한 이미지였는데, 오늘 필요 이상 정직한 건 아닌가.
"아직 50%도 다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내 인생의 그늘을 전부 쓰려면 우선 제 슬픔에 못 이긴다. 자식들 입장도 있고.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 단지 내가 한 이야기가 푸념이나 넋두리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독자들 인생에 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힘내요, 힘내. 우리 모두 멀쩡하고 근사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힘내라는 말이 필요한 사람들 아닌가."
―이 낙차와 격차가 당신의 문학을 빚었을까.
"문학이 고통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겸허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 숙명여대 국문과를 다닐 때도 안 되는 일이 없었다. 당연히 교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삶을 겪으며 겸허해지고, 낮추는 걸 배웠다. 인간이 가진 진실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면서, 그걸 한 번 풀어헤쳐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는, 불덩이 같은 사회적 욕망도 한몫 했을 것이고. 이 모든 게 도움이 되었겠지."
1964년 데뷔니 내년이면 등단 50주년이고, 첫 시집을 낸 지는 올해로 40년. 다른 직업이었다면 '숙련'이 어울릴 시간의 경과일 것이다. 하지만 시인은 이번에도 필요 이상으로 정직했다.
"내가 50년을 시인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50년을 해도 일류가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같다. 50년을 해도 무릎 꿇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좋은 것 아닐까"
―시인으로서의 50년 동안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은.
"어려울 때는 사실 문학도 포기할 수 있다. 당연히 삶이 먼저지. 하지만 시는 정말로 질투 많은 애인이다. 산문과 소설 베스트셀러 덕분에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빚도 갚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 감정과 노동을 산문 쓰는 데 다 바쳐 버렸다. 다른 것 하다가 돌아오면 시가 잘 안 받아 주더라고. 그때 썼던 시를 보면 너무 관념적이다. 참 후회스럽지. '너밖에 없어'라고 전력을 다해야 자기를 조금 보여줄까."
자신의 겸사대로 그는 일류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를 향한 태도만은 이류가 아니었다. '질투 많은 애인'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시인은 오늘도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다. 유일한 무기는 '정직'이라 믿으며. 두 서랍 사이의 낙차와 격차를 몸 깊숙이 새긴 채로.
채널 19·오늘 저녁 7시 50분
'<시 읽기·우리말·문학자료> > 우리 말♠문학 자료♠작가 대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보문고, 국내 첫 정액제 ‘샘’ 출시… ‘빌려보는 전자책’ 논란 (0) | 2013.02.23 |
|---|---|
| 2009년 신춘문예 최고의 시 ‘담쟁이 넝쿨’…‘2009 신춘문예 왕중왕 전’ 시 부문 결과 발표 (0) | 2013.02.22 |
| 재미있는 우리말 - '삼가해'라는 말은 삼가주세요 (0) | 2013.02.20 |
| 산문집 ‘김수영의 연인’ 펴내는 시인 김수영의 아내 김현경 씨 (0) | 2013.02.20 |
| 우리말 예절 21 - 영희 씨, 무얼 드시겠어요? (0) | 2013.02.14 |
